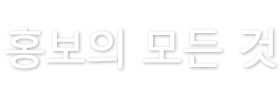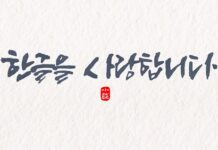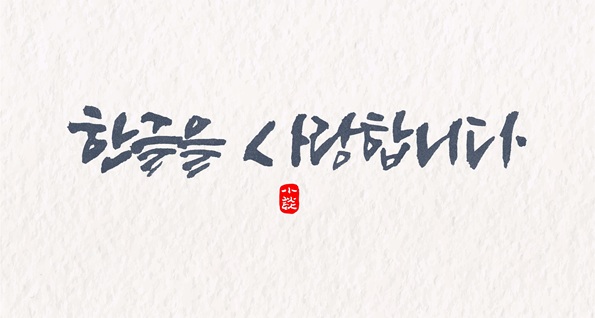
1. 쉽고 명확한 표현 지향
한자어, 일본식 표현, 관료적 용어는 가능한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.
예) ‘입장’ → 뜻·견해 / ‘비교하다’ → 견주다 / ‘위치하다’ → 있다
불필요한 표현 반복은 피하고 문맥에 맞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야 한다.
2. 자주 틀리는 표현 바로잡기
접수하다: 신청자가 아니라 기관이 접수함 → “신청했다”로 바꿔야 한다.
자문하다: 자문을 ‘받는’ 것이 맞음 → “자문을 구했다” 또는 “제언을 받았다”
탑재하다: 기술을 ‘넣다’, ‘적용하다’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.
소요되다: “걸리다”, “들다”로 대체 가능하다.
3. 비슷하지만 다른 말 구분
‘아닌/아니라’, ‘한참/한창’, ‘피다/피우다’, ‘재연/재현’ 등 혼동하기 쉬운 표현은 구별이 필요하다.
예) “한참이던 전쟁”이 아니라 “한창이던 전쟁”, “담배를 피다”가 아니라 “피우다”.
4. 잘못 쓰이는 말 고치기
황망하다: ‘급하다, 허둥지둥하다’는 의미로 ‘허망하다’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.
등극하다: 우승이나 최고일 때만 사용한다.
유명세: 고통의 의미 포함 → 긍정적 의미에 쓸 수 없다.
터울: 형제 사이 나이 차에만 해당 → 일반적 나이 차에는 “차이”를 사용한다.
5. 치우치지 않는 표현
기자의 주관이 섞인 표현은 피한다.
“강조했다”, “비판했다” → “밝혔다”, “말했다” 등 중립 표현을 쓴다.
고객 → “이용자” 또는 “소비자”로 수정 권장한다.
피동형 표현(“의견도 있다”, “해석된다”) 대신 주체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.
6. 차별하지 않는 말쓰기
장애를 앓다 → “장애가 있다”로 표현한다.
정상인/일반인 → “비장애인”으로 통일한다.
여기자, 여교수 등의 성별 접두어는 필요 시에만 사용한다.
집사람, 안사람 등은 아내, 남편으로 바꿔 표현한다.
출처: 우리말 기자 수첩